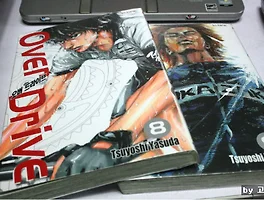들은 이야기(좋은 책이라는^^)가 있어서, 큰 기대를 하고 책을 펼쳤다. ‘사진에 곁들어진 글을 읽는 것은 인터넷으로 충분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멋진 은유가 가득한 책을 읽고 싶다는 욕망이 넘쳐 책을 들게 된 것.
사진과 글을 함께 엮은 스타일의 책은 많다. 잡지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빠른 속도로 읽고 마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금세 해치우겠다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더니 하품만 나고 재미가 없다. ‘아, 역시 내 스타일이 아니야’하며 책을 멀찍하게 치워두었는데, 다른 책을 읽다가도 눈에 밟히고, 몇몇 사진이 떠올라서 결국은 다시 책을 들었다. 그리곤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글을 읽는 호흡을 최대한 길게 했다. 그제서야, 맛이 난다.
글들의 잔치
천천히 글을 읽다보니, 글쓴이의 문장이 예사롭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국어교사라고는 했지만, 글 솜씨가 이렇게 뛰어나다니.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난다. ‘언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지 않다면 결코 쓸 수 없는 문장이라고 생각된다. 하나의 단어, 혹은 자음, 모음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봤을 때, 글쓴이의 사려깊음을 느끼게 된다. 화려한 표현으로 마음을 뺏는 것이 아니라, 진솔한 은유로 마음을 움직인다.
“학자금 대출은 가난한 사람들 순이 아니었다. 은행 서류는 신용도 높은 고급 가난자를 골라내고 있었다”라든가 “나는 침묵을 들고 아버지와 병원에 갔다”, “사랑은 인간의 눈을 표준렌즈에서 광각렌즈로 전환시킨다. 왜곡이 시작되고, 편애가 진행된다”, “아무래도 겨울 산행은 저 시퍼런 호통에 개기는 맛이다” 그리고 “잘 마른 높새바람이 며칠간 건조시켜 놓았던 동해안 마을이었다”, “길상사 관세음보살은 속세의 악다구니와 어처구니에서 시선을 거둬 고요히 마당을 들여다 본다”와 같은 글잔치가 벌어진다.
그들의 속사정
예술의 경지에 이른 풍광이나 혀가 감탄했다는 맛집을 소개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여행 책자처럼 상세한 정보로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 책은 여행을 부른다. 일반 여행 책자에서 포장된 굉장한 것들은 막상 만나면 시시해지기 십상인데, 이 책은 무엇보다 과대포장이 없다. 게다가 눈여겨 보지 않을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다. 글쓴이는 말하는 것 같다. 가만히 앉아 바라보면 무생물에서 생명을 느끼게 된다고. 그들의 숨소리, 말소리, 표정까지도 다 느끼게 된다고.
덕분에 가보고 싶은 곳이 많아졌다. 지금은 모두 쫓겨난, 나병으로 아픈 환자들의 집성촌이었던 부산 용호동과 유흥준 문화재청장의 이름이 새겨진 낙산사의 동종, 돌이나 쇠로 새긴 우정과 사랑의 증표로 몸을 버린 경주 안강의 옥산서원, 결핵으로 방광까지 드러냈었던 지금은 별세하신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님의 안동 생가, 장작개비로 만든 법정 스님의 의자가 오롯이 놓인 전남 순천 송광사 불일암 등. 글쓴이를 통해 이들의 속사정을 듣고 나니 몸이 더 들썩거린다.
여행 친구는 자전거
대부분의 여행은 이십대에 차비를 아끼기 위해 산 무거운 철제 자전거(접이식)로 다녔다고 한다. 이제는 수명을 다해 전시품처럼 집 마당에 서 있지만 한때는 그 누구보다 역동적으로 팔도를 돌아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다. 글쓴이는 때때로 자전거를 주체로 해서 글을 쓰기도 한다. 여행을 다니고 글을 쓰는 것이 한상우인지, 자전거인지 모를 일이다. ^^
'자전거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길 위의 삶이란 이런 것 『가보기 전에 죽지 마라』 (4) | 2011.09.18 |
|---|---|
| 알고 타면 더 재미있다 『재미있는 자전거 이야기』 (2) | 2011.09.04 |
| 거짓말도 실력일까? 『1894년, 애니 런던데리, 발칙한 자전거 세계일주』 (2) | 2011.07.24 |
| 로드레이스 만화의 결정판 『오버 드라이브』 (2) | 2011.05.24 |
| 타 보면 안다 『즐거운 자전거 생활』 (0) | 2010.11.10 |